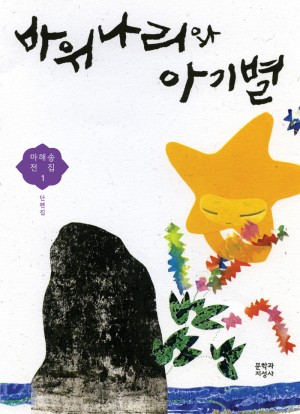마해송의 작품을 읽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. 마해송 작품에는 유머가 담겨 있다. 마해송 전집 1차분으로 나온 단편 모음집을 쭉 읽어 보니, 웃음이 나온 이야기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작가가 부조리한 현실과 대신 싸워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. 이럴 때 작가가 쓰는 언어는 풍자적이면서도 거침이 없다.
한 예로 『멍키와 침판찌』란 작품이 있다. 작품 시공간의 설정이 재미있다. 멍키라는 원숭이만 사는 섬에 덩치가 큰 놈이 끄나풀을 데리고 왕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. 이 왕과 끄나풀의 말을 듣지 않는 원숭이들은 꼬리가 잘리거나, 궁둥이의 가죽이 벗겨지거나, 얼굴의 가죽이 벗겨져 시뻘겋게 되었다.
하루는 이 섬에 왕 멍키 원숭이보다 덩치가 몇 갑절이나 큰 침판찌들이 나타났다. 침판찌들은 멍키들에게 왕이 있는 것이 좋은 지, 없는 것이 좋은 지 ‘작대기 내기’(투표)를 하게 하였다. 50마리를 뽑아서 작대기 내기를 하는데, 오른편에 던지면 왕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, 왼편에 던지면 왕이 없어야 좋다는 것으로 셈해서 결정하기로 하였다.
이러자 왕 멍키의 끄나풀들은 침판찌 몰래 다니면서 오른편에 던지는 놈이 있으면 자지를 벤다고 위협을 하고 다녔다. 자지를 벤다고 하는 설정에서 우선 웃음이 빵 터진다.
그러면 작대기 내기를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? 끝 부분을 같이 읽어 보자.
뽑힌 멍키 50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작대기를 들고 올라갔다.
끝나고 보니 얼씨구, 왼편에 49, 오른편에 단 한 개 작대기가 있었다.
셈이 끝나자 침판찌들은 왕 멍키와 끄나풀들을 모두 둘씩 셋씩 한 손에 뭉쳐 쥐고 꼼짝을 못하게 했다.
멍키들은 좋아라고 서로들 얼싸안고 끼끼끼 까까까 꾸꾸꾸 야단법석이었다.
아들 멍키는 아버지 멍키에게로 뛰어 갔다.
“오른편 작대기 한 개 아버지지? 자지 벤다는 게 무서워서 아버지만 왕이 좋다고 했지? 겁쟁이! 나는 부끄럽다.”
아들은 벌벌 떨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할퀴었다. 그러자 모두들 모여 와서 그것을 알고 야단을 하니 침판찌는 아버지 멍키도 손아귀에 집어넣어 버렸다.
그다음 날 이 섬에는 왕도 끄나풀도 보이지 않았다. 침판찌도 보이지 않았다. 침판찌가 모두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모른다. 멍키 원숭이들은 거리끼는 것 없이 활개를 펴고 잘 놀았다.
그러나 벌을 받은 자리는 그대로 빨갛다.
시공간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다.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는 설정 자체가 매우 흥미롭기도 하다. 보통 민담에 보면 구질서를 상징하는 아버지는 죽고,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아들은 새 삶의 여행을 떠난다. 민담이 담고 있는 전복의 상상력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『새벗』(1966년 11월호)에 발표되었다. 60년대 한국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는 의미 또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마해송 동화는 언제 읽어도 늘 새로운 느낌이 든다. 유머의 힘이 느껴져서 그럴 것이다.